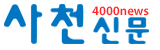|
| |
|
『 사천의 역사와 유적지를 찾아서 사천 곤명면 본촌리 유적(3) 』
 |
1.청동기시대 유적의 발견
1992년 남강댐 수몰 지구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가 국립경상대학교 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등이 참가했다.
진주, 사천지역의 조사를 맡았던 경상대학교박물은 덕천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며 지표조사를 했다.
경상대학교박물관은 덕천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며 지표조사를 하던 중, 곤명면 본촌리 마을 앞 들판에서 고려시대 석·불상과 주춧돌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절터는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까지 운영되었던 자복사(資福寺)가 있었던 곳으로 밝혀져 특정 사찰이 아니라, 각 지역에 존재했던 재지사찰(齎持寺刹:수행 때문에 오후에는 공양을 하지 않는다는 원시불교이래의 법을 지키는 절)이다.
이곳 발견 장소에서 수많은 기와 편과 무문토기편이 흩어져 있었다. 이곳에는 고려시대 절터와 청동기시대 유적이 있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경상대학교박물관은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석불을 중심으로 절터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고려~조선시대의 폐사지가 확인 되었고 그 아래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 유적이 확인 되었다.
이곳 폐사지 아래의 집 자리와는 전혀 다른 초대형 집 자리가 발견되었다. 이곳의 집 자리120n2)에는 돌대문 토기, 적색마연장경호, 대형호, 장방형석도, 합인석부 등 청동기시대의 가장 이른 시기에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청동기시대 문화가 꽃핀 중기의 집 자리가 대개 2㎡ 내외의 면적이므로 후대의 집보다 5~6배나 큰 형태였다.
이처럼 이른 시기에 초대형집이 건축되고, 수백년이 지난 늦은 시기에 오히려 소형집이 사용된 것은 건축학적 발달 관점에서 보면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거주형태에서 부부 중심의 소형 집들이 군집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사회변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2.바다로의 소통 길목에 위치한 본촌리 유적
곤명면 본촌리 유적은 남강의 큰 지류인 덕천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합수 지점에 남강댐이 건설 되었다.
덕천강 유역은 아직 발굴조사가 많지 않아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규모 충적지(沖積地)가 발달해 있고, 강안의 저 구릉과 평지에서 지석묘 등 많은 유적이 발굴되었다.
본촌리 유적은 바로 이러한 덕천강 내륙과 사천 해안지대의 소통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는 남강유역에서 제작된 옥(玉), 해안지역에서 생산된 패각, 동검 등이 출토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교류의 중심에는 생필품인 소금과 식량의 교환이 인정되었다면, 교류는 상호간의 정보공유는 매우 긴밀했을 것이다.
덕청강은 사천만의 검정리에서 곤명 완사로 흐르며, 남강 본류는 가화천 또는 사천의 축동에서 유수로 이어진다.
이 강들은 약9~10km 불과한 바다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해안지대에는 조선시대 곡물을 모아두는 각종 창(가산창, 장암창, 제민창, 통양창)이 있어, 내륙의 물자들이 이들 강을 따라 내려와 보관 되었던 것을 확인 활 수가 있다.
또한 인류조사에 따르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라도에서 출향한 상선(젓 배, 소금 배)이 이곳으로 들어와 곡식류 등을 화폐와 교환했다고 한다.
이러한 물자교류는 청동기시대에도 적용가능 했다고 본다면, 사천 본촌리 유적일대는 청동기시대 남강유역사람들이 해안지역과 교류하던 소통 길의 유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촌리 유적의 입지를 보면 덕천강이 곡류하면서 만든 활주사면(滑走斜面)의 섬으로 형성되어있다.
유적의 맞은편으로는 강의 공격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기암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곡류하는 물의 하방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곡류하는 물의 하방침식에 의해 물이 깊어져 소(召)를 이루어 이 일대는 어류자원과 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형이다.
비교적 높은 지형에 위치한 유적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된 지역이었지만, 유적위로 퇴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대 사람들의 굴착행위에 의한 파괴가 계속되어 청동기시대 집자리의 바닥면 가까이 끼지 도달했다.
3.대형 집자리· 토기와 석기 출토
본촌리 유적에서 가장 대형의 집 자리는 폭이 8.3m로서 다른 주거지에 비해 훨씬 대규모다.
기둥은 주초석위에 2x6열로 배치되어 있다. 집 자리 북동 모서리에는 대형 토기 3점이 ⅓가량 묻힌 채 출토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토기와 석기가 출토 되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유물을 살펴보면 먼저 사격자 모양의 줄무늬 토기가 출토되었다. 줄무늬 토기는 토기 동체부에 끈을 묶어 토기를 지지하였던 흔적이다.
그런데 끈 흔적 부분이 발색되어 있고, 끈이 없는 부분이 그을음에 흡착되어 있는 것에서 끈 흔적은 사용 시에 형성된 흔적으로 생각 된다.
한편 본촌리 주거지에서 구연부(口緣部) 경부에 횡침선문이 새겨진 토기가 여러 점 발견되었다. 이러한 토기는 한반도의 다른 유적에서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형태이다. 앞으로 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송영진: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영제: 1996. 서부경남의 유적보존과 조사실상
박원철 :2004.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마을의 인류학적 조사
경남발전연구원: 사천 방지 유적
국립진주박물관: 2015. 내 고장 역사탐방
김을성: 2015. 사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이야기
본지 주필·사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 김을성 2020년 02월 13일 11시 00분 / 문화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