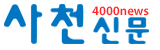|
| |
|
『 향토시인 최송량 선생 시비 제막식에 붙여 2020년 5월 30일 11시 노산공원 끝자락에 』
 |
향토시인 최송량(사진 1940~2015) 선생의 시비 제막식이 5월30일 11시 노산공원 끝자락 선배시인 박재삼 시인의 시비 옆에 세워 진다.
이 시비는 재경삼천포고등학교 동문회(회장 엄종명)에서 세우고 사천문화원, 사천신문사에서 후원한다.
최송량 시인은 사천 동서동에서 출생하여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중학교, 삼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최 시인은 박재삼 선배 시인을 만나 “월간문학” 13회 신인상으로 늦깎이 세른 살에 등단했다. 최 시인은 평생 고향에 살아오면서 고향의 문학 세계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고향에서 선배님들을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면서 멀고도 험준한 시의 길을 걸어온 향토 시인이다.
최 시인의 생전에 남긴 글에 “칠십년이란 세월은 길기도 하지만 천년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회한(悔恨)이 먼저 눈시울을 적신다.” 고 생전에 말했다.
그동안 “천사의 옷깃처럼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시를 남기지도 못했고 천날만날 어정뱅이 시를 쓰다가 황혼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에 잠기곤 했다.”고 생전에 남긴 말이다.
지난 60년대 초반인 학창 시절부터 시에 목을 걸고 죽자 살자 발버둥 쳐왔지만 아무른 수확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 면서 고향의 선배 시인을 만나 시인이 되고자 결심했다.
박재삼 성님보다 더 좋은 시인이 될 거라며 자나 깨나 시에 목을 매단지가 벌써 50년을 홀쩍 넘었다.
내가 시인이 되고자 재삼 성님에게 시인이 되는 길을 물었다. 시인이 되고 싶으면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를 백번 읽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시인이 되고 싶다면 시인이 되라고 잘라 말했다.
처음엔 말테의 수기를 백번을 읽는 것이 시인이 되는 지름길인줄 알았다. 나는 참 바보였다.
뒤에 안일이지만 인간의 삶이, 사람이 되고 난 뒤에야 시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았지만 진실 된 삶이 주는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으면서 시를 쓰는 일을 시인 행사를 하였으니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나는 시를 쓴 일을 슬프게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시는 아니 독자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시는 슬픔과 죽음까지도 극복 할 수 있는 갖고 싶은 시가 때어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까지 삶에 대한 존재의 불안과 부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먹고 싶은 시를 짓지 못하는 올챙이 시인으로 남아 있다.
나는 시인이 되고자 일찍부터 무척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뒤로 꾸준히 노력한 끝에 1968년 신문 문예에 응모한 작품이 여러 신문에 최종 심사까지 올랐다.
그러나 해를 거듭 할수록 심사 위원들의 작품 평에서 시가 너무 가볍고 안이하며, 참신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때 내 나이는 이십대를 넘어서 삼십에 토를 달았으니 젊음의 참신한 맛보다 감성의 매너리즘에 빠져 시 마저 한풀 꺾이고 때가 묻어 있어서 당선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시절에는 문단에 등단해야 떳떳한 시인으로 행사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밤낮 없이 10년을 노력하여 1973년에야 겨우 문단의 등용문을 찾아 오를 수 있었다.
향토 시인 최송량 선생의 남긴 글을 읽으면서 비록 고향 삼천포에서 고향의 선배와 후배들에게 고향 삼천포를 잊어버리지 않게 고향의 정서가 담긴 시를 남기고 가셨다.
최 시인은 1973년까지 삼천포문협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문학 저변 확대와 시 창작에 몰두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했다.
“삼천포 육자배기” 출간 이후 4년이 지난 1991년 7월 제2 시집 “왜 잘나가다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란 말인가? 라는 시집을 출간 하면서 당시 삼천포 비하(卑下)하는 민중들에게 삼천포를 알리고 고향을 잊지 않게 하는데 시를 매체로 삼고자한 향토시인이다.
삼천포라는 작은 항구는 나의 고향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고향에 때 묻지 않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 있는 지역이라 자랑하고 싶어 고향에 대한 자연을 마음껏 노래하기도 했다.
최송량 시인은 1998년 나의 시를 있게 한 박재삼 시인이 서거하여 제1회 박재삼 추모 문학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으며 박재삼 문학관이 노산공원에 건립하는데 힘써 왔다.
그는 죽을 때까지 시를 잊지 못하고 고향에 묻혀 살면서 고향을 붙들고 시를 붙들고 살아야 할 숙명으로 살아온 향토의 시인이다.
최 시인은 50년이란 긴 문학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기 위해 시의 길을 죽을 때까지 고향 삼천포에서 살아 왔다.
<2면에 계속>
최 시인의 자작시 “요즘 와서는” 시로 최 시인의 살아온 길을 볼 수 있는 시 한 수를 올린다.
“요즘 와서는”
예순에 토(吐)를 단 무인년 유월 열이틀 / 삼십사년 공직을 하직하면서 / 눈물 반 웃음 반으로 서먹이는 나에게 / 아내는 서글픈 웃음만 나온다면서 / 슬픔이 팔할인데 피리우는 소리로 / 시정(詩情)이 아부지하고 눈물로 부르지만 / 가는 귀가 먹어서 듣고도 못 들어 / 이제는 좀 쉬어야 겼다 하면서 / 시력까지 갔다고 하늘이 노랗다고 하네 / 말테의 수기를 백번 읽어도 / 아직까지 시의 봄은 오지 않고 / 요즘 와서는 오줌발이 영 말이 아니게 / 찔금찔금 눈물방울처럼 약해졌다네
<최송량 시인이 걸어온 길>
삼천포초등. 삼천포중. 삼천포고등학교. 수산대학교 수학하고 “월간문학으로 등단했다. ‘1965년 율시조 문학 동인으로 활동하다 한국문학 사천문협지부장 역임. 첫 시집“삼천포 육자배기”와 둘째 시집 “왜 잘나가다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란 말인가” 셋째 시집 “서쪽에 뜨는 달” 넷째 시집 “까치놀 우는 저녁 바다” 다섯째 시집 “떠나가는 섬” 여섯째 시집 “바흐를 보면서” 등이 있다.
1993년 경상남도예술인상(문학부문). 1996년 경상남도문화상(문학부문). 1998년 녹조근정훈장을 수훈 하고 공직을 퇴직 했다. 2002년 제14회 경남문학상 수상.
김을성 기자 kimes4000@naver.com 2020년 05월 28일 10시 38분 / 문화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