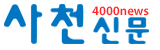|
| |
|
『 사천의 역사와 유적지를 찾아서(28) 현존하는 고지도를 통해 살펴 본 곤양관아 』
 |
고려시대에 곤명현은 진주의 속현이었다. 곤명현에는 중앙에서 별도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으며, 진주에 파견된 지방관이 곤명현을 관할하였다. 당시 곤명현에는 별도로 읍사(邑司)를 설치하여 토착의 향리(鄕吏)들이 읍사에서 자치적으로 지방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 향리의 권한과 지위는 약화되었다. 1419년에 곤명현이 진주로부터 독립하고 남해현을 통합하여 곤남군이 되면서 최초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그런데 현이 아니라 군으로 읍격이 정해진 데에는 이곳이 세종의 태를 안치한 장소라는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조선시대에 곤양군의 관아가 위치했던 곳은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일원이다. 곤양읍지(昆陽邑誌) [서두]에는 곤양군은 동쪽으로 사천(泗川)까지 30리, 서쪽으로 하동(河東)까지 10리, 남쪽으로 남해(南海)까지 40리, 북쪽으로 진주(晉州)까지 37리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관찰부(觀察府)까지의 거리는 50리, 서울과의 거리는 957리로 가는 데 열흘 반이 걸렸다.
[성지 항목]에는 곤양군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석축주회 3,765척, 높이 12척, 여첩(女堞) 767, 성문(동·남·북), 옹성 18, 성내 우물 3과 연못 2 등이 적혀 있다. [창고 항목]에는 사창고(司倉庫), 군기고(軍器庫), 노량창(露梁倉)의 위치정보가 담겨 있다. 곤양군의 향교(鄕校)와 문묘(文廟), 사직단(社稷壇), 성황단(城隍壇), 여제단 등은 관아에서 사방 2리 내에 위치하였다. [호구 기록]에 따르면 신묘년(1831년) 호적상 원호(元戶)는 3,686호, 인구는 15,272구였으며, 그 중 남자는 7,871구, 여자는 7,401구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곤양군에는 종4품의 군수(郡守)와 종9품의 훈도(訓導)가 파견되었다. 18세기의 지리서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곤양에는 4품의 무관(武官)이 군수로 임명되며,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군관(軍官) 50명, 인리(人吏) 32명, 지인(知印) 15명, 사령(使令) 20명, 관노(官奴) 8명, 관비(官婢) 11명이 편성되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도 종4품의 군수가 임명된다는 내용이 있다.
규장각 해동지도(海東地圖)[英祖1724-1776]에 그려진 곤양관아는 동문 옆에 객사(客舍)가 있고 성(城)중앙에는 관아의 중심인 수령이 정사를 보는 아사(衙舍) 즉, 동헌(東軒)이 있으며, 서남쪽에 OO헌(軒)이 있다.
규장각 소장 영남읍지(嶺南邑誌)(1871년)에 수록된 경상도 곤양현 지도에는 사또가 집무를 보는 동헌(東軒)은 서쪽에서 내려온 산줄기를 등지고 동향하였으며, 사또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왕에게 충성을 맹서하는 객사(客舍)는 평지에 남향하였다. 지도는 풍수의 명당에 자리 잡은 동헌을 기준으로 하여 서쪽을 위에 그렸다. 동헌 아래 북문 쪽에 향청(鄕廳), 군사(郡司), 군관청(軍官廳)이 있고 그 아래에 인리청(人吏廳), 봉서루(鳳棲樓), 사창(司倉), 군기고(軍器庫)가 보인다.
1872년 지방지도와 비슷한 고려대학교 소장 곤양지도(昆陽地圖)에는 곤양 내 위치한 동명(洞名)과 촌명(村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 지명 아래에는 읍치에서 그곳까지의 거리도 기록되어 있다. 지도 오른쪽 상단에 필사 연기가 임신(壬申) 3월로 명기되어 있는데, 연호가 없어 년도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양식과 지질을 고려하였을 때 순조12년(1812)나 고종9년(1872) 중 하나가 간사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읍성으로 둘러싸인 읍치 공간에는 동헌(東軒), 객사(客舍), 사창(司倉), 화약고(火藥庫), 군기고(軍器庫)의 관청 건물과 더불어 사대문도 뚜렷하게 그려 넣었다. 남문외촌(南門外村)에 옥(獄)이 있고, 가전촌(加田村)에는 향교(鄕校)와 사창(社倉)이 있으며, 두동촌(杜洞村) 너머에는 성황당(城隍堂)이 있고, 서승촌(西昇村)에 여제단이 맥사촌(麥舍村) 인근 산 정상에 사직단(社稷壇)이 보인다.
곤양군읍지(昆陽郡邑誌)[간행연도 光武3年 1899]에는 읍성의 석축과 성문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으며 내부에는 서문 쪽에는 관아 건물인 동헌(東軒), 형방청(刑房廳), 낭관청 사령청(使令廳), 통인청(通引廳), 인리청(人吏廳), 군관청(軍官廳), 창고(倉庫), 명문루, 객사(客舍), 제기고(祭器庫)등이 정확하진 않지만 표현되어 있고, 남문성 밖에 옥(獄)이 있다.
연대별 각기 다른 화공들에 의해 제작된 지도의 모습은 비록 제각각이지만 영남읍지(嶺南邑誌)와 곤양군읍지(昆陽郡邑誌)에 기록된 곤양관아의 형태가 다소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조선시대의 지도는 결코 한두 사람의 손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왕명을 받은 관리들, 편찬을 맡은 학자들, 지형을 살폈던 지관들, 지도를 필사했던 화원들과 수발하던 수많은 다모(茶母)들, 목판을 새겼던 각수(刻手)들, 그리고 지도를 찍어냈던 인출장(印出匠)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남길 수 없었던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각 지도에 표기된 곤양군현의 관아 건물 구조 및 건물명칭 설명
·동헌(東軒): 지방 관아에서 고을 원(員)이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및 그 밖의 수령(守令)들이 공사(公事)를 처리하던 중심 건물.
·객사(客舍): 중앙으로부터 임금의 뜻을 받들고 내려온 사신들을 머물게 하며 접대하던 건물이기도 하였으며, 관찰사가 순시 차 들르면 잔치를 벌이거나, 백성들에게 향시를 베풀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객사는 각 지방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에 세워지거나 관아와 나란히 지어지곤 하였다. 관사(館舍)·객관(客館)이라고도 하였다.
·형방청(刑房廳): 지방에서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던 곳.
·사령청(使令廳): 장교청(將校廳)의 하부 기관으로 사령들의 집무실로 사용되던 곳.
·통인청(通引廳): 통인(通引)은 잔심부름을 하는 아전(衙前)을 말한다.
·인리청(人吏廳):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던 하급 관리인 아전들이 사무를 보는 곳.
·군관청(軍官廳): 군관들이 집무를 보던 관청.
·제기고(祭器庫): 제사 때에 쓰는 그릇, 기구 따위를 넣어 두는 창고.
·옥(獄):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한때 형무소라고 부르다가 현재 교도소로 고쳤다.
·아사(衙舍): 수령이 집무하던 동헌(東軒).
·사창(司倉): 양곡(糧穀)을 맡아보던 곳.
·화약고(火藥庫): 화약을 저장하여 두는 창고.
·군기고(軍器庫): 병장기(兵仗器) 등을 보관하였던 창고.
·향청(鄕廳): 지방의 수령을 자문, 보좌하던 자치기구.
·군사(郡司): 지방 행정 단위의 하나인 군(郡)의 행정 직무처.
참고 문헌: 조현근 팬저의 국방여행, 곤양읍지(昆陽邑誌), 고려대학교, 서울대 규장각
문화부장 김진식
kimarami2005@naver.com
2020년 11월 05일 11시 40분 / 문화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